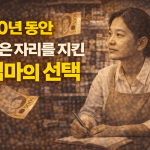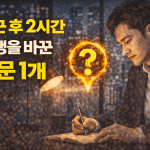1장. 쫓겨난 날, 인생이 끝난 줄 알았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서 쫓겨났던 날은
신문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게 끝난다.
“창업자가 회사에서 해고되다.”
하지만 그날을 당사자의 몸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건 해고라기보다 추방에 가까웠다.
자기가 만든 세계에서,
자기가 쌓아 올린 이름으로부터
완전히 밀려나는 경험.
그는 훗날 그 시기를 이렇게 말한다.
“공개적인 실패였다.”
이 표현이 중요한 이유는,
실패보다 더 아픈 게 **‘보여지는 실패’**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실패할 수 있다.
하지만 모두가 아는 실패는
자존감보다 먼저 정체성을 무너뜨린다.
그 시절의 잡스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위대한 잡스’가 아니었다.
연단 위에 서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환호 속에서 박수받는 CEO도 아니었다.
그는
어제까지 내 명함이던 것이
오늘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사람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이야기를 빨리 넘긴다.
곧바로 넥스트 이야기로,
픽사 이야기로,
그리고 다시 애플로 돌아오는 서사로.
하지만 슬리피타이거는
이 장면에서 멈춘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돌아오기 전의 시간’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잡스가 애플을 떠난 직후,
그에게 남은 건 두 가지였다.
시간과 불안.
시간은 많아졌지만
쓸모가 없어 보였고,
불안은 커졌지만
어디에도 쓸 수 없었다.
그는 말한다.
“모든 걸 잃었다고 느꼈다.”
이 문장은 성공한 사람의 겸손이 아니다.
그 시점에서의 그는
정말로 모든 걸 잃은 상태에 가까웠다.
우리는 이 감정을 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다 잠드는 밤.
오늘 하루가
내 인생에 아무 의미도 남기지 못한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드는 생각은 항상 같다.
“이렇게 가다 끝나는 건 아닐까.”
중요한 건,
이 시기에 잡스는
아직 ‘교훈’을 만들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사람들은
“그때의 실패가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라는 문장을
결과를 알고 난 뒤에만 말한다.
하지만 그 시간 속에 있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하루를 넘기는 게 전부다.
의미도, 방향도 없이.
이 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그가 무엇을 배웠는지가 아니라,
그가 그때 무엇도 배우지 못한 상태로
그냥 하루를 살았다는 사실이다.
잡스는 훗날
이 시기를 ‘잘린 시간’이 아니라
‘남은 시간’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이 말은
그날 바로 나온 말이 아니다.
버텨낸 뒤에야
겨우 붙일 수 있었던 이름이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이
혹시 자신의 시간을
‘잘려나간 시간’이라고 부르고 있다면,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아직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시간에
우리는 늘 그렇게 느끼기 때문이다.
다음 장에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그 시간이
왜 실패가 아니라 공백이었는지를
조금 더 천천히 들여다볼 것이다.
성공은 아직 오지 않았고,
교훈도 아직 없다.
그저, 남아 있는 시간만 있을 뿐이다.
2장.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은 실패가 아니라 공백이었다
애플을 떠난 뒤의 스티브 잡스는
갑자기 한가해졌다.
회의실도, 발표 무대도,
그를 부르던 전화도 사라졌다.
대신 생긴 건
아무도 묻지 않는 시간이었다.
사람들은 흔히 이 시기를
“재기의 준비 기간”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그 표현은
너무 결과를 앞당긴 말이다.
그때의 잡스는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확신조차 없었다.
그저,
비어 있는 날들을 견디고 있었을 뿐이다.
넥스트(NeXT)를 만들던 시절,
그의 하루는 조용했다.
투자자도 많지 않았고,
시장은 반응하지 않았으며,
언론은 관심을 거뒀다.
성과는 없었고
속도는 느렸고
확신은 더더욱 없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시간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처럼 보였다는 사실이다.
세상은 이런 시간을
실패라고 부른다.
아니면 최소한,
쓸모없는 대기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슬리피타이거는
이 시간을 다르게 부른다.
공백이라고.
공백은 실패와 다르다.
실패는 끝이 있지만,
공백은 아직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을 뿐이다.
문제는
공백에 있을 때
사람은 스스로를 가장 많이 의심한다는 것이다.
“지금 내가 하는 게 맞나?”
“왜 나는 아직 여기 있지?”
“다른 사람들은 이미 앞서 가는데…”
잡스 역시 다르지 않았다.
그는 나중에
이 시기가 가장 불안했다고 말한다.
성공해서 불안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하는 상태로
시간이 흐르는 것이 불안했던 것이다.
이 장면은
지금 우리의 밤과 닮아 있다.
퇴근 후 책을 펴도
한 페이지를 넘기지 못하고,
새로운 걸 해보겠다고 앉았지만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하루가 끝나는 순간.
그럴 때 우리는
그 시간을 실패라고 부른다.
“오늘도 날렸다”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 시간은
당신의 속도를 다시 맞추는 중일지도 모른다.
잡스의 넥스트는
당시에는 실패에 가까웠다.
대중의 관심도,
상업적 성과도 없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 조용한 시간 덕분에
그는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었다.
쫓기던 창업자에서
다시 생각하는 사람으로.
공백은
사람을 단련하지 않는다.
사람을 정리한다.
무엇을 계속 가져갈지,
무엇을 내려놓을지.
우리는 흔히 말한다.
“잘 되기 전에는 고생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말은
공백에 있는 사람에게
아무 위로도 되지 않는다.
더 필요한 말은 이거다.
> 아직 이름 붙일 수 없는 시간도
충분히 유효하다.
지금 당신의 시간이
아무 의미 없어 보인다면,
그건 실패해서가 아니라
아직 설명할 말이 없어서일 가능성이 크다.
잡스가 그랬던 것처럼.
다음 장에서는
이 공백의 시간이
왜 나중에 와서야
‘남은 시간’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인식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태도를 남기는지
이야기해보려 한다.
성공은 아직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
지금 이 시간을 대하는 방식이 나온다.
3장.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가
지금 이 시점에 다시 읽히는 이유는
그가 결국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다.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는
언제나 소비된다.
필요할 때만 꺼내 쓰고,
상황이 나아지면 잊힌다.
하지만 그의 이 시기는 다르다.
아직 아무것도 증명되지 않았고,
아무도 확신해주지 않았으며,
본인조차 이 시간이
어디로 가는지 몰랐던 때.
바로 그 지점이
지금 우리의 자리와 닮아 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실패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고 잘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저,
중간에 멈춰 있는 상태다.
퇴근은 했지만
하루를 마무리한 느낌은 없고,
무언가를 시작하자니
이미 너무 늦은 것 같고,
아무것도 하지 않자니
이대로 사라질까 불안하다.
이 상태를
우리는 자주 실패라고 부른다.
하지만 잡스의 이야기는
이 질문을 던진다.
> 정말 실패일까,
아니면 아직 이름이 붙지 않은 시간일까.
그는 나중에서야
그 시기를 ‘남은 시간’이라고 불렀다.
이 표현이 특별한 이유는
시간의 성격을 바꿔서가 아니다.
시간을 대하는 태도를 바꿨기 때문이다.
잘린 시간이라고 부르면
그 시간은 잘려나간다.
의미도, 가능성도 함께.
하지만 남은 시간이라고 부르면
그 시간은 아직 사용 가능해진다.
비록 지금은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도.
슬리피타이거는
이 지점에서 멈춰 서고 싶다.
성공을 서두르지 않고,
결론을 앞당기지 않으며,
지금 이 시간이
당장 증명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자리.
당신의 오늘이
눈에 띄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에게도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아직
정리 중일 뿐이다.
잡스는 공백의 시간에
위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세상을 바꿀 선언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 시간을 떠나지 않았다.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하다.
버텼다는 말도 부족하고,
이겨냈다는 말은 더 과하다.
그는
그 시간 안에 계속 머물렀다.
지금 당신이
자신의 시간을
잘려나간 시간이라 부르고 있다면,
오늘부터는
이렇게 불러도 된다.
남아 있는 시간이라고.
아직 쓰이지 않았고,
아직 설명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오히려
다른 가능성을 품고 있는 시간.
슬리피타이거는
그 시간을
조급하게 밀어내지 않는다.
느리게,
그러나 끝까지.
이 글을 덮는 순간에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을지 모른다.
그래도 괜찮다.
오늘 하루를
잘라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
🐯
느린 호랑이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저, 기다릴 뿐이다.